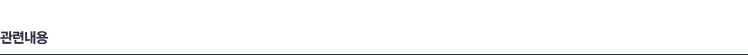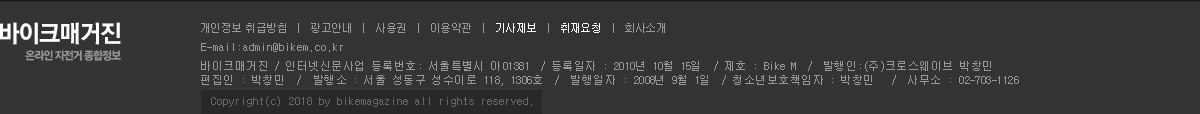|
||
|
에디터 : 이호선
|
아침 7시 반, 피우라(Piura)시(市)를 향해 페달을 밟는다. 도로 주변은 이미 완벽한 사막이다. 생명을 상징하는 푸르름도, 풍요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 오지 않는다.
오후 3시경, 페루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만나는 팬 아메리카나(Pan Americana)선 상의 도시, 피우라(Piura)에 도착한다. 여느 중남미 국가들의 도시와 마찬가지로 수 많은 경찰들이 곳곳에 깔려 있다. 은행입구에는 사설경비원이 아닌 정복의 경찰관이 꼼짝 안하고 붙어 서 있고 오토바이를 탄 순찰경관은 도로의 곳곳을 쉴 새 없이 누비고 다닌다. 거리는 수 많은 사람들로 파도치고 성당에선 미사가 한창이다.
오늘이 26일로 일요일이구나. 나는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져 인적이 한참 뜸한 뒷골목을 샅샅이 뒤져 나의 호스텔(5불)을 찾아 낸다. 피우라 시(市)는 그리 큰 편도 아니고 별 특이함도 없는 심심하기 짝이 없는 시(市)이다.
|
팬 아메리카나(Pan Americana)선 상의 모래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첫 번 째 공식적인 도시, 피우라(Piura). |
|
피우라(Piura)시를 지나 약 40km정도의 구간까지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마을이 보이기도 한다. |
|
"사막지대(Zona de Dunas)"라는 옐로카드의 경고와 함께 무가지경(無家之鏡), 무인지경(無人之境)의 끝없는 지평선만이 이어 질뿐이다. |
자, 다음 역이 치크라요(Chiclayo)시(市)인데 200여km 전방이야. 이제부터는 팬 아메리카나(Pan Americana)야, 달려 보자니까!
그런데 이건 또 뭐야?! 도로도 도로변에도 당나귀 마차들이 난주(亂走)한다. 이 곳은 사막지대로 물이 귀해 물장수들이 당나귀 마차로 물을 가정집이나 업소에 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세 바퀴의 자전거 수레에 막대한 양의 물을 싣고 기듯, 걷는 듯 가는 모습 또한 아주 종종 목격된다. 내가 중국을 여행하는 동안 자주 경험했던 모습이 이제 여기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피우라(Piura)의 외곽지역을 지나 도로변에 있는 간이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두 명의 트럭운전사가 나에게 넌지시 묻는다.
"저기 말이야, 혹시나 해서 물어 보는데 치크라요(Chiclayo)시(市)까지의 도로주변이 어떤 풍경인지 알고 있나?!"
"……..?!?!?!?"
"잘 모르고 있는 게 틀림이 없군. 그게 말이야, 이곳도 이미 사막이지만, '치크라요'까지는 완벽한 사막으로 민가도 가게도, 그리고 식당도 없는 허허 모래벌판 일뿐이야.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해서 출발해야 할거야!"
나는 먹던 밥을 서둘러 해치우고는 물 2.5L 한 통을 작은 병에 분산시켜 채워 넣고 가게에 있던 빵을 모조리 나의 가방에 처 넣은 후, 커피 한 잔을 아주 거하게 마시며 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고비사막의 전설을 되 새겨 꼭꼭 씹기 시작한다.
여기서 또 200km의 사막을 넘어야 한다고?!!
'피우라'에서 약 40km까지는 비록 완벽한 사막지대 이긴 해도 자그마한 마을들이 이어지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뭐냐구?!! 6개월 만에 나는 또 다시 사막으로 돌아 오고 말았어!"
나는 하늘을 우러러 소리친다. 사막을 가르며 달리는 도로에서는 콜롬비아와 에쿠아도르에서 이제껏 나를 집요하게 물고 흔들었던 심각한 오르막 길이 사라지고 평지나 아주 완만한 오르막길이 대세가 된다.
한 마디로 쥑여 주는 꿈의 도로가 되는 거지.
그런데 말이야, 불행하게도 바이커들에겐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요. 사진 속에는 완벽하게 텅 빈 듯한 사막이지만 말이네, 그 텅 비어져 있어야 할 공간을 사정없이 눌러 채우는 것이 바로 무시무시한 사막의 바람이라오!
아무리 평지에 주단의 길이면 뭘 하겠소?! 그 웬수 같은 바람으로 둥글기만 한 두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지를 않으니…
그 평평하기만 한 검은 주단 위를 오늘 하루 종일 10시간을 달린 거리가 겨우 95km이라오.
제일 높은 7단까지 체인을 올려 놓아야 그나마 두 바퀴가 앞으로 굴러간다고! 하지만 사막여행에서 확실히 좋은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은 바람이 워낙 세고 밤부터는 기온의 급락으로 피에 굶주린 '(모기)눔 스키'들의 비행이 원천봉쇄 되어 그 스키들 걱정 안하고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지.
|
사막의 오아시스! |
오랜만에 다시 모래벌판 위에서 반짝이는 수 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는 동안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고비사막에서도 그랬듯이 텅 빈 사막을 페달 저어 가다 보면 나는 내 몸 속에서 은밀하게 배회하고 있는 부당하고 부적절한 정체불명의 욕심과 집착이 모두 모래알처럼 부서져 사방에 흩어지며 텅 빈 깡통이 되고, 모래바람이 텅 빈 사막을 가득 채우듯이, 자유의 바람으로 꽉 들어 찬다.
사막은 부당한 욕심과 집착으로 얼룩진 인간들을 정화시키는 산소통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사막의 마력(魔力)이여!
새벽 5시에 눈을 떠 6시경, 사막을 걸어 나와 다시 바람과 정면대결을 하며 또 다른 긴 하루와의 끈질긴 싸움을 시작한다. 다행스럽게도 최소 40km전후로 식당이나 가게가 하나, 아니면 둘 정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오늘은 어째 초반전부터 죽을 지경이다. 여행의 천적인 설사가 시작되었고 온 몸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어제 밤 허허벌판 모래 위에서 최소한의 바람막이조차 없이 뚝 떨어진 기온에 차가운 바람을 그대로 맞으며 퀵 샤워를 하던 중 온 몸이 무차별로 떨렸다.
고비사막에서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철로를 따라 주기적으로 대형 배수로가 나타났고 배수로의 시멘트 구조물이 얼마간의 모래바람을 막아 주곤 했지만 이 곳에서는 배수로가 거의 없다.
|
또 하나의 처절하게 메마른 시, 모르로페(Morrope). |
심각한 근육통으로 무릎에서 불이 날 지경이지만 죽음같은 78km를 달리자 작은 시(市), 모르로페(Morrope)가 앞으로 고꾸라지려는 나를 감싸 안는다. 정말 처절하게도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다. 이런 곳에서 삶을 이어 나가고 있는 이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공식적인 호스텔이 전혀 없는 곳으로 주거용 여인숙(5불)을 간신히 찾아낸 후 침대 위에 무너진다.
설사와 고열로 고통의 신음소리와 함께 밤새 침대 위를 뒹굴고 있다. 감기몸살과 설사는 최악의 컴비네이션으로 나를 극도로 혼란 시킨다. 감기몸살의 치료를 위해 이를 악물고 먹지만 너무도 허무하게 그대로 물이 되어 쏟아져 나간다.
뱃멀미의 고통이나 설사의 고통은 막상막하다. 먹으며 토해야 하는 뱃멀미처럼 움직이기 위해서는 먹으며 싸는 수밖에 없다. 비상 약으로 가지고 있는 '정로 환'과 설사약을 줄기차게 먹고 있으나 전혀 듣지를 않는다.
경미한 설사는 보통 '정로환' 두어 번으로 합의를 보고 떨어지고 마는데 이번의 설사는 상당히 심각하다.
밤새 생사를 오락가락하다가 또 다른 아침을 마주한다. 어금니 질끈 물고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주어 여관방을 기어 나와 또 다시 페달 위에 발을 얹는다. 작은 마을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바삭바삭 메말라 붙은 대지 위로 태양은 무자비하게 타오른다.
고열로 눈을 뜰 수가 없고 설사로 기운이 없어 페달에 힘이 안 들어가 자전거는 비틀비틀 겨우겨우 굴러가고 있다. 30km를 필사적으로 기어 또 다른 큰 도시인, 치크라요(Chiclayo)시(市)에 입성한다.
여관들은 지천으로 한 바탕 여러 사람 괴롭혀 골목골목을 돌아 보지만 싸구려 여관을 찾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죽인 끝에 결국 주거용 여인숙(5불)을 찾아낸 후, 감기몸살과 설사와의 더블매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창문 조차 없는 치크라요 시(市) 여관 방의 침대에서 어둠을 응시하며 고통과 신음 속에 2011년으로 가는 다리를 아주 힘겹게 건너고 있다.
|
팬 아메리카나(Pan Americana)선 상에 있는 또 다른 대도시인, 치클라요(Chiclayo). |
여관이 있는 골목의 입구에는 2명의 경관이 하루 종일 서 있는데, 내가 식당에 오 가는 도중 서로 마주치곤 한다. 내가 자전거여행자로 세계를 여행 중이라는 사실에 서로의 고개를 끄덕이며 나와 심각하게 공감(共感)을 하던 그들이,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는 어째 무감(無感)이다.
"너희 나라에서는 무엇을 생산하느냐?!"
허ㅡ어, '탐보그란데'의 아저씨들에 이어 또 다시 듣게 되는 기가 막힌 질문이다. 유치하지만 긴 말 안하고 끝내기 위해선 휴대폰 제시요구뿐이다. 두 개 중 하나가 모토롤라, 그리고 또 하나가 LG! 고개를 끄덕이며 구름 걷힌 파란하늘처럼 명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몰려드는 구름과 불어대는 모래바람으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들의 무지(無知)를 탓하기 보다는 우리 자신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우리의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내가 식사를 하고 온 중국식당의 T.V에서도 에쿠아도르에서와 마찬가지로 '윤 은혜'의 그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으나 드라마의 대화는 변함없이 스페인어로 더빙되어 이곳의 시청자들 모두는 그것을 중국의 드라마로 알고 있다.
중남미 인들의 우리에 대한 무지(無知)는 결국 우리자신이 짊어져야 할 몫이다. 밀려오는 중국의 거대한 파도를 굳세게 타고 넘으며 도도히 우리의 항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세계 최고를 향한 무한도전, 결사도전뿐이다.
|
내가 6일간 머문 주거용 여인숙(5불). 이 방에서 3일을 뒹굴며 앓은 후 감기 몸살의 정상을 간신히 넘었으나 설사증세는 3일을 더 한 후에야 비로소 멎었다. |
고열로 부풀어 올랐던 입술의 한 꺼풀이 벗겨지며 감기몸살의 정상을 가까스로 넘었으나 설사는 그칠 줄을 모른다.
결국 7일째가 되어 대변이 뭉치기 시작한다.
여행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