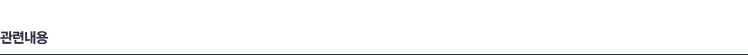|
||
|
에디터 : 박창민 기자
|
지난해 5주년 기념을 맞아 자전거 업계의 대표적인 월간지로 자리매김을 한 '월간 더 바이크', 그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한 송해련 편집장과 만나 자전거 이야기를 나누어보았다.
편집장님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대학에서 졸업 후 방송 작가 생활을 좀 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돌아와서 영화와 와인 전문지의 편집장 역할을 했었죠.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전거를 못 타게 해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생활하다보니 자전거를 못 타면 생활이 거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게 배웠는데, 타는 시간보다 끌고 가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였지요.
일본은 정말 다양한 자전거가 있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그 다양성에 있어서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자전거는 가장 자유로웠던 시간에 만난 새롭고 고마운 존재였다고나 할까요.
일본에 간 이유는?
영화에 대한 마케팅을 배우고 싶어 갔는데, 특히 만화영화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 일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노는 문화'에 더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와인과 요리에 대한 문화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문화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내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자가 내 천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었습니다.
|
일본 유학시절 디즈니랜드에서 |
|
자전거와의 인연은 일본 유학시절에서 시작되었다. |
월간 더 바이크 편집장이 된 계기는?
한국에 와서도 자전거를 계속 타게 되었고,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 친구의 아는 분이 자전거 전문지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때마침 편집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처음 접하는 분야의 잡지여서 겁이 나기는 했지만, 임우택 대표님께서 "마음대로 만들어 봐라"라는 이야기에 힘을 얻어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월간 더 바이크 10호가 나올 때 편집장으로 투입되어 5년 정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처음에는 편집을 하면서도 정말 잘 하는 것인지 두렵기도 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 하나 쌓이면서 없던 곳에서 조금씩 우리의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의 매력?
다양함인 것 같아요. 와인에 끌렸던 것도 누구와 마시냐, 어떤 음식과 함께 마시냐에 따라 항상 다른 다양함 때문이었는데, 자전거도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다양한 것을 갖고 있고, 그 다양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깊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성과 다양함, 그리고 와인처럼 '놀고 먹으면서'하는 일이 자전거에서도 똑같은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자전거는 이런 다양함 속에 여행, 건강, 레저와 같은 문화도 있고 첨단적이면서도 가장 아날로그적인 것이도 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함이 자전거의 큰 매력이라고 봅니다.
|
월간 더 바이크 식구들과 함께 |
월간 더 바이크 잡지의 방향성은?
전문지이지만 전문성에 대한 논란과 재미에 대한 요소, 그런 방향성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 하는 방향은 잡스러운 이야기를 다루는 잡지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하고 때로는 전문적이어야 하고, 때로는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잡스럽게 섞여 있을 때 우리들만의 개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올해의 콘텐트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전문지로서 사실적인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콘텐트를 보여주는 방법에 있어서 비쥬얼적이고 디자인적인 면을 조금 더 추구하고자 합니다. 때론 긴 기사의 내용보다 한장의 사진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낌을 잘 전달하기 위한 비쥬얼적인 요소들이 잘 쓴 기사보다 더 효과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잡지 환경에 있어서도 인쇄의 한계를 넘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에 대한 대응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할 때가 된 듯 합니다.
6년째로 접어든 월간 더 바이크는?
작년에 5살이 되면서 걷는 것을 넘어 뛰는 것으로 가야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자전거라는 전문성과 사진이나 글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춰야 하는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사진을 잘 찍는 것만으로는 자전거의 전문성을 살리기 어렵고, 일반적인 기사를 다루기에는 전문지라는 특성을 잃기 쉽고, 대중성과 전문성의 문제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감사한 일은 매년 구독자의 수가 꾸준히 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2011년 자전거 업계의 전망을 본다면
같이 가야 한다는 동료의식을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날씨의 문제 등 어려움 속에서 서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커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문화적인 부분으로는 로드 시장도 커지고, 커다란 대회의 영향력도 커진다는 변화가 있어서 더욱 다양한 자전거의 시장이 된다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에 반해 산악자전거 대회와 프로 선수들의 입지가 줄어든 것 같아 아쉽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지는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생각은?
공무원들이 자전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실수를 하는 것이 많아 보인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것만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갑갑하죠.
인프라를 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스타일의 매체가 되었으면?
회사의 나이와 잡지의 나이가 같은 상황에서 잡지, 대회, 이벤트, 웹서비스, 프로모션, 선수들의 후원 등 자전거에 있어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 잡지도 그 솔루션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월간 더 바이크'는 전문지이지만 조금 더 가벼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니아들이 아닌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지하철 안에서, 화장실에서도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잡지로써 무게를 덜어내어야 할 필요가 있는거죠.
송해련 편집장은 "자전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기보다는 가볍게 장바구니를 단 자전거에서 천만원이 넘는 자전거까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전하며, 또한 서로 경쟁업체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는 매체로서 '바이크매거진'과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