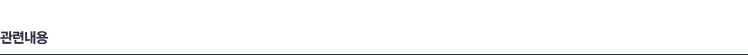|
||
|
에디터 : 이호선
|
|
또 하나의 고산시티, 하카라(Jakala) |
정말 끔찍스런 하루로 '물' 한 낱말로 너무도 충분히 요약되는 하루였다.
오늘 하루 종일 달린 거리가 50km라니 정말 나를 기가 막히게 한다. 그나저나 이 지경의 몸 상태와 이 지경의 날씨에 내가 과연 몇 일이나 더 버텨낼 지 나의 눈앞은 이미 암흑 속의 끝 모를 터널이다.
아침에 또 쏟아지는 비에 눈을 떠 그저 천정만 올려다 보고 있다. 어제 하루 종일 비바람에 시달려 감기몸살까지 온 듯, 온 몸은 괴롭고 머리 속은 수 많은 생각으로 혼란스럽다.
11시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비가 멈추고 신통치도 않은 햇볕이 생색내듯 아직 두터운 구름을 들락거린다. 계속되는 망설임과 주저 속에 결국 페달에 발을 얹는다.
나의 뇌는 진저리나는 물속에서 이미 골아터져 흐믈거리고 있으나 사고로 이미 부서져버린 심장은 억수 같은 비에 침수된 채, 불규칙하고 힘겨운 피스톤운동을 계속하며 결코 침몰만큼은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버티고 있다.
|
내가 멕시코에 들어 와 처음으로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던 11세 소년, 에리아스 산체스(Elias Sanchez). |
|
하카라(Jakala)를 지나 달리다가 멕시코 시티를 193km남긴 지점에서 만난, 아델라이도와 조수석에 동승한 앰뷸런스. |
몇 km를 달렸을까, 멕시코 시티(Ciudad de Mexico)를 193km 남긴 지점에 페멕스(Pemex) 주유소를 발견하고 좀 쉬고 싶어 자전거를 세운다. 결코 길지 않은 휴식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은 또 그 구태의연한 카드를 집어 든다.
"빌어먹을 하늘, 빌어먹을 비!" 또 처마 밑으로 기어들며 한 숨을 연발하고 있는데 주유소 앞에 급정거하는 앰뷸런스.
"어, 이게 누구야?!!" 그저께 밤, 내가 신세를 진 아델라이도(Adelaido)와 그의 아들, 엠마뉴엘(Emanuel)이 조수석에서 내려오고 운전석에선 처음 보는, 상당히 터프해 보이는 사나이가 내려온다.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기에 나는 이미 맛이 가버린 나의 뇌와 뇌의 인지능력을 의심하고 한참을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델라이도(Adelaido)는 일요일이 아닌 오늘, 토요일이 휴일이라 그의 아들과 앰뷸런스 운전사인 그의 친구, 토마스(Tomas)의 차를 타고 멕시코 시티에 가는 길에 이렇게 나를 만난 것이다. 드디어 나는 이미 멍텅구리가 된 나의 뇌를 쥐어 박고 다그치며 선택의 뽑기 통을 흔든다.
나는 멕시코 최대 도시인 멕시코 시티를 피해 파추카(Pachuka)를 지나 프에블라(Puebla)를 거쳐 남쪽으로 달려 과테말라로 갈 예정이었는데 지금의 상황에선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 어느 도시라도 상관없이 저렴한 여관을 찾아 쉬면서 나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최선이고, 만의 하나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움직이기 빠르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앰뷸런스에 탄다.
내가 사고를 당했던 타마순차레(Tamazunchale)에서 일축했던 앰뷸런스의 귀신이 기어코 나를 쫒아 와 나를 데려간다. 차를 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가 앰뷸런스를 부술듯이 두들겨 댄다. 어쨌거나 이제부터 나와 엘파마는 비로부터 안전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졸음이 나의 온 몸을 덮친다.
내가 뒤 칸의 간이의자에 앉은 채로 이리저리 머리까지 부딪혀가며 졸고 있을 동안 그들은 어느새 파추카(Pachuka)를 지나고, 기여코 멕시코 시티(Ciudad de Mexico)의 시 외곽 지역에 있는 앰뷸런스 센터 앞에서 정지한다.
이곳에서 '아델라이도'와 '에마뉴엘'은 차에서 내려 버스정류장으로 향하고 나는 시 외곽도로를 타고 시내로 들어와 중심가를 향해 달려가다가 '라빌라(La Villa)'라는 한 변두리 마을에서 정지한다. 중심가에 들어가보았자 모든 것이 비쌀 뿐이다.
사람에게 물어 어렵지 않게 찾은 호텔 '라빌라(La Villa)'. 50년이 넘었다는 이 호텔은 싸구려 호텔이다. 200 페소로 우리나라 돈 2만원이다. 그 동안 열흘 가까이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멕시코 땅에서 이 보다 싼 호텔 구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는 멕시코에서의 한 단락을 끝 맺는다.
|
멕시코 시티의 시 경계 지역에서부터 시내를 향해 진입한다. |
|
아스라히 바라보이는 빌딩 숲들의 곳이 멕시코 시티의 다운타운이다. |
내가 지금 처한 이 비상상태에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이 첩첩 산중, 첩첩 구름 속이다. 불확실의 바다에 빠져 연방 물을 먹으며 허우적대고 있는 가운데 단 한가지 명료하고 선명한 것이 있다.
"이 호선, 너는 아직 풀어야 할 '구라(口羅)' 보따리를 잔뜩 짊어지고 있어!!"
|
멕시코 시티의 변두리 지역인 라빌라에서 페달 질을 멈춘다. 중심가보다는 변두리가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더 쌀 것이라는 생각으로. 깨진 나의 몸을 추스리고 재활을 하기 위해 아무래도 상당일 걸릴 것 같으니 말이다. |
|
파란 선이 자전거 주행구간. 미국지도 위의 붉은 선은 그레이하운드 버스로 이동 한 구간이고 멕시코 지도 하단의 붉은 선이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한 구간이다. |
정말 찰떡같이 찰 지고 단단한 '아픔의 진흙'이 나의 전신을 감싸고 있다. 단단한 찰흙의 미이라가 되어버린 나의 몸을 여관의 샤워장에서 더운 물과 찬 물을 번갈아 반복하며 녹여 보지만 역시 쉽사리 풀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다시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 이 짓을 계속해가며 완벽하게 굳어버린 두터운 찰흙 속의 근육과 뼈들을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본다.
처음엔 1시간, 그리고 2시간을 여관 방의 큰 거울 앞에 서서 부질없는 짓거리처럼 여겨지는 이 짓을 하루, 이틀, 그리고 3일을 하는 동안 어느덧 철벽 같이 단단한 '아픔의 찰흙' 벽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비로소 근육의 움직임의 각도와 강도를 높여간다.
이를 악물고 진땀을 흘리며 격렬한 몸의 흔듬을 계속하는 가운데 '아픔의 찰벽'이 서서히 터지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역시 찰흙은 찰흙 일뿐으로……
움직임의 각도와 강도를 계속 상향조정 해가며 시간까지 늘여 아침 2시간 반, 오후 2 시간 반으로 늘린다. 이제 여관방은 나에게 정형외과의 재활병동이 되었지만 나만의 재활병실은 일반병원의 그것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고통의 한숨과 신음만이 난무하는 일반병원의 그것과는 정반대로 노소남녀들의 절정을 치닫는 삶의 찬가가 밤과 낮을 구별하지 않고 계속된다.(모든 여관방의 작은 창문들이 자연환기를 위해 항상 열려있다.) 나는 이 역동적인 생의 찬가를 반주 삼아 더욱 맹렬한 움직임을 계속한다.
|
멕시코 시티 외곽의 동네, 라빌라의 여관 종업원인 다니엘(Daniel)이 내가 몸이 아프다는 말에 사과와 우유를 건네주며 위문. |
|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열심히 일을 하며 맥주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즐기는 착한 다니엘과 함께 |
재활운동을 시작한 지 7일째가 되는 오늘, 비로소 나는 본능적으로 나의 생존을 확인한다.
나는 비로소 여관의 뒤뜰에 나가 어제 오늘 상쾌한 파란색을 일관하고 있는 하늘을 올려다 본다.
"어머니, 어머니의 막내아들이 또 다시 살아났어. 내가 고난도의 '트리플 러츠'를 감행하며 하늘을 날다가 불행히 추락하며 위험천만으로 내 몸이 차갑고 단단한 대지와 억지 키스를 했는데, 그 순간 내 몸을 묶고 있던 번지로프를 강력하게 위로 당겨 올리며 하마터면 대지를 쪼개고 그대로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 묻혀버릴 뻔 했던 나에게 변함없이 생존의 환희를 만끽하게 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어머니시지요!!!"
여행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