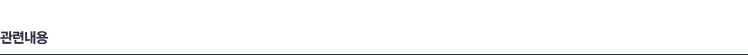|
||
|
에디터 : 이호선
|
이젠 강물이 흐르는 다리를 찾는 것이 하루의 중요 일과이고 희망이 되었지만 정작 다리 밑으로 진입하는 통로를 찾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 종종 다리주변은 벼랑이 되어 마을을 통해 빙 돌아가야 한다. 더구나 어둠 속에서 진입통로를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어둠 속을 달리다가 다리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난간에 세워 놓고 진입구를 찾다가 자전거가 들어갈만한 개구멍을 발견하고 막무가내로 다리 밑으로 내려가니, 큰 바위들로 둘러 쌓인 강변의 조그마한 모래밭에 모닥불의 재들이 아주 새롭고 선명하다.
아주 최근에 불을 피운 것임에 틀림이 없다. 마을이 이곳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악동들의 아지트인가?! 그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언제 올 것인가?! 이미 대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는 없어 한 참 동안 모래 밭에 그저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본다.
놀랍게도, 비록 티베트의 그것처럼 선명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성군(星群)이 보인다. 이곳의 반딧불들은 거짓말 몇 방울 떨어트려 그 광도(光度)가 후래쉬 수준이다. 나는 종종 누군가가 후래쉬를 켜고 나를 향해 달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한다.
역시 나의 예상대로 개구멍을 타고 여러 개의 후래쉬가 어지럽게 교차한다. 4개의 불빛이니 최소한 4명이다. 하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잔뜩 긴장하고 있는 나를 비웃듯이 코웃음 치며 내가 있는 곳의 반대편으로 반딧불이 되어 날아간다. 나는 또 다시 밝은 달 빛 아래 강물이 되고 자연 그 자체가 되었다.
편평한 도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말 뜨거운 태양과 종종 불어대는 강한 바람을 뚫고 힘겨우나 멕시코 최후의 구간을 달리고 있다는 조금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페달에 힘을 준다. 90km를 달려 상당히 큰 국경도시인 타파출라(Tapachula)에 도착한다.
여러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150페소의 여관을 발견한다. 어제부터 뒤 짐받이 부분이 삐걱거려 확인을 해 보니 뒤 짐받이대가 부러졌고 설상가상으로 오늘 뒤 바퀴살이 부러졌다. 여관 방에서 당장 자전거와 씨름을 해야 할 판이다.
여관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인이 나의 이력을 듣고 싶어해 나는 피곤함을 무릅쓰고 길지 않게 '구라'를 푼다. 입을 꾹 다물고 두 눈을 내리깐 채 심각하게 듣고만 있던 그녀가 난데없이 나의 목 줄기를 우악스럽게 움켜쥐고 비틀며 나의 숨통을 조인다.
"너 돈이 참 많은가 보다?!! 도대체 너는 얼마나 돈이 많은 거야?!!"
"으, 으……윽, 내가 이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면 내 집, 내 방도 없어. 나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역 주변의 아저씨들과 함께 지내야 할 판이야!"
소통의 즐거움을 위한 사람들과의 대화가 종종 이렇게 사람의 기(氣)를 막히게 하여 숨을 헐떡이고 끝내 숨쉬기 운동을 포기하게끔 협박을 당하곤 한다.
어쨌거나 야무지게 움켜 잡혀 휘둘렸던 나의 목 줄기를 쓰다듬으며 여관을 나와 여관 주위를 걷다 보니 어두운 조명아래 먹자골목이 등장한다.
수 많은 먹거리 노점상들이 잔뜩 물을 먹고 숨도 못 쉬며 바닥을 허우적거리고 있던 나의 마음을 단박에 수면 위로 끌어 올린다.
"이제야 정신이 드는군, 이제야 살 것 같아!"
세계의 어느 국경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상점과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도시전체가 정신 없이 돌아가고 있다. 과테말라(Guatemala)와의 국경 지대답게 많은 과테말라 인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장사를 하고 있다.
그들 중 상당 수의 중국인들이(주로 식당을 중심으로 하는) 있어 나를 경탄시킨다. 외국인 불모지, 특히 동양인 불모지인 이곳에서조차 중국인들은 그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곳에서 4일을 있는 동안 값싸고 다양한 길거리 먹거리에 푹 빠져버린 나의 위(胃)가 나의 떠남을 주저하게 만들지만 나는 또 가야만 한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나를 오라 손을 흔드는 사람은 없지만, 나는 가야 한다.
국경을 향해 달리는 도로와 도로 주변은 여느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고요하다. 그런 고요함 속을 달리며 멕시코를 되새긴다.
멕시코의 자연은 이제껏의 세계여행 중 처음으로 겪는 풍경으로 그 동안 그저 무심하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나의 멕시코 관을 근본부터 뒤집어 엎었다.
나는 그 동안 정말 미안할 정도로 멕시코에 무지했다. 멕시코는 장대(壯大)라는 낱말이 딱 들어맞는 자연 그 자체의 나라다. 장대한 자연, 숨죽이는 풍경에의 끊임없는 감동과는 별개로 자전거 여행자는 몇 바스켓 분의 땀방울과 힘겨움, 그리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강력한 별종 모기스키들의 횡포를 각오해야 한다. 그나마 따스한 멕시코 인들과 담백하고 화끈한 멕시코음식이 있어 견딜 수 있었다.
|
북미의 대형 모기에 비해 이곳의 모기는 '하루살이'급의 소형모기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소리 없이 다가왔다가 감쪽같이 사라지지만 그것들이 지나간 후의 후유증은 결코 대형모기의 그것 못지않게 상당시간 지속된다. |
어느 나라이든 국경 언저리는 언제나 혼란스럽다. 그 동안 있었던, 조금은 익숙해 상황판단이 가능해진, 나라를 뒤로 하고 또 전혀 예측을 불허하는 다른 나라로 넘어 가는 일은 긴장, 그 자체다.
국경을 100여m 남기고 정체불명의 친구들이 나를 따라 붙는다. 국경을 넘기 위해 국경검문소에서 수속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의 주위를 떠나지 않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들의 정체는 바로 허가 받은 환전상들로 국경 주변에는 수 십 명에 달하는 그들이 있을 뿐 아니라 환전상들의 바람잡이들까지 있어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다.
이 환전상들은 환전비율도 각양 각색일 뿐 아니라 얇고 보잘 것없는 과테말라 지폐의 허점을 이용해 지폐의 장수까지 교묘하게 속여가며 얼빠져 있는 관광객들을 농락하고 있어 정신을 바짝 붙들어 매고 있어야 한다.
마침 오늘(10월 20일)이 과테말라의 혁명기념일로 은행이 문을 닫아 이들이 더욱 난리를 치고 있다. 단 한 푼의 과테말라 돈(Quetzal)도 없는 나는 1시간 이상을 돌며 50불만 겨우 바꾸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나는 또 다른 유일한 외국인을 만났는데, 그녀는 미국 버지니아 출신의 백인 아줌마로 과테말라에 영구 이주를 목적으로 이 곳에 들어 온 여자다.
"미국은 속속들이 썩어 버려 이젠 그 어떤 희망도 없어! 없는 희망 중에 유일한 희망이란 미국을 떠나는 것뿐이지.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보따리를 싸고 나의 뒤를 따르고 있어."
그녀는 이미 머리에 쥐가 날만큼 혼란스런 나의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대기까지 한다.
뒤죽박죽으로 일관하던 나의 머리 속도 국경을 지나자마자 시작되는 지독한 경사의 길을 낑낑대며 오르고 있는 동안 하나하나 제 자리를 찾고 정상으로 되돌아 온다.
"내 앞에는 또 내가 달려야 할 길이 계속되고 있고 나는 그 길 위를 변함없이 달리고 있어."
9월 18일, 북 멕시코의 몬테레이(Monterrey)를 떠나 9월 24일, 산악도시인 타마순차례(Tamazunchale)에서 사고를 당한 후 멕시코 시티의 외곽마을, 라빌라(La Villa)의 여관에서 9일 동안(9월 27일- 10월 5일) 재활을 마치고 다시 주행을 시작해 10월 15일 국경도시, 파출라(Tapachula)를 거쳐 과테말라 도착.
멕시코에서의 주행 총 거리가 1,833km이다.
여행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