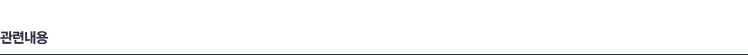|
||
|
에디터 : 이호선
|
|
도로변의 빵집에서 제빵 기술자들과 함께. |
|
빵 만드는 곳에서 |
2km정도의 가파른, 터키의 국경으로 향하는 산악도로는 이미 죽음처럼 얼어붙어 있다. 가즈빈(Qazvin)에서 '알리'가 준 두터운 옷이 없었다면 거의 동사(凍死)할 지경이다.
국경마을, 도브즈(Dovz)에 와서 남아 있던 이란 돈, 리알(Rial)을 터키의 돈, 리라(Lira)로 바꾸려 하나, 어느 환전소나 은행도 리알을 상대해 주지 않는다. 100US달러를 바꾸면 920,000리알이다. 한국의 원(Won)과 또 다시 10 : 1 이다. 만 원짜리 지폐로 92장이다. 대단한 부피의 돈이다. 이란 리알이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돈이 마치 종이 쪼가리라는 느낌이 든다.
파키스탄에서 국경을 넘어 이란에 올 때 국경지대에서 어깨에 긴 자루나 큰 비닐봉지를 메고 환전 상대를 찾던 환전상들이 생각난다. 돈 가치 없는 ‘리알’지폐의 부피가 너무 커서 큰 자루나 비닐봉지에 돈을 넣어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한 환전소에서 주인인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그가 직접 일필휘지로 "알라는 이세상의 유일신이다.(Allah is the only God in the world.)"라고 적어준 종이를 받는 조건으로 나에게 돈을 바꿔주는 엄청난 자비를 베풀었다.
나는, 동토(凍土)의 터키를 횡단하는 유일한 외국인 여행자가 되어 두 명의 남자차장(?!)이 승차한 고속버스를 타고 달린다. 그들은 간간이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한다. 자동소총과 경기관총의 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검문소(Jandarma)의 검문은 아주 철저하다.
앙카라까지 가는데 4번의 검문을 받는다. 검문 때마다 권총을 찬 고급하사관이 올라와 전승객의 신분증을 걷어가지고 내려간다. 그리고 그것들을 초소에서 일일이 조회를 한 후에야 다시 남자승무원에게 돌려주고 그들은 그것을 승객들에게 일일이 돌려준다.
한 번은 한 젊은 청년의 신분증에 무슨 이상이 있는 듯, 그는 그 검문소에서 300여m 떨어져있는 경비대 본부까지 걸어서 같다가 돌아온다. 버스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두말없이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시간이 아주 많이 지체된다. 도시의 공중화장실까지 소총을 멘 군인들이 서있다.
|
왼쪽으론 에게해(海)를 오른쪽으론, 끝없이 펼쳐지는 유럽의 대평원을 가르며 나는 이미 유럽횡단을 시작했다. |
앙카라(Ankara)를 지나면서부터 비로소 늦가을, 초겨울의 날씨가 나타난다. 온통 눈으로 덮여있던 삭막한 풍경이 사라지며 부드럽고 따뜻한 녹색의 들판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록 하늘은 퉁퉁 부어 터져있어 정말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스탄불(Istanbul)은 두말이 필요 없이 크고 아름답다.
그렇지만 동서양에 걸쳐있는 이 거대도시를 빠져나가기 위해, 나는, 수도 없이 뺑뺑이를 치며 오랜 시간동안 진땀을 빼야만 했다.
내가 도로를 달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We're brothers!(우리는 형제)"를 외친다. 추운 날씨에 달리는 나에게 베푸는 뜨거운 ‘차이’-중동 지역사람들의 주요 차로서 홍차를 말하는데, 인디아와 네팔에서는 밀크를 넣은 영국식 홍차를 마시고, 파키스탄과 이란, 그리고 터키에서는 그저 엄청난 양의 설탕만을 넣은 홍차를 마신다. -에 얼어붙은 나의 몸이 눈 녹듯이 녹는다.
이스탄불을 지나 국경마을, 입살라(Ipsala)가 가까워옴에 따라 철책 없는 국경너머, 유럽의 땅으로부터 라디오를 통해 이 아시아의 땅을 두드려대는 새로운 리듬의 음악소리는 바로, 웨스턴 팝이었다. 그 동안 인디아, 파키스탄, 이란, 터키 등 모슬렘 권의 리듬에 익어있던 나에게는 정말로 잠을 깨게 하는 소리였다.
그리스와 터키의 국경경비병들은 마치 다정한 친구들처럼 서로 마주보며, 장난도 쳐가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들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한다. 고독한 여행자인 나는 잠시나마 그들과 어울려 따뜻하고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리스 측 병사 중 한 명은 대학생이라고 한다. 6개월 후면 제대를 할 것이고, 제대 후엔 나처럼 자전거여행을 하고 싶다고 희망찬 포부를 밝힌다.
오늘이 2007년, 12월 30일. 나는 비로소 한 발자국도 안 되는 국경선을 넘어 유럽의 태양아래 섰다.
|
터키 측 국경 경비병들보다 훨씬 더 기합이 빠져 보이는 그리스 측 경비병 둘이 나를 열렬히 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