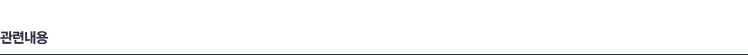|
||
|
에디터 : 박규동
|
|
장유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 논과 논 사이로 난 길은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
나의 여행은 유목이 아니었다.
매일 이사하는 것이었다. 먹고, 입고, 잠잘 집을 담은 짐수레를 자전거 뒤에 달고 초원과 사막과 도시와 바다를 향해 매일 떠나는 것이었다. 바다에서는 초원이 그리웠고, 도시에서는 사막이 그리웠다. 목포에서는 부산이 그리웠고 부산에서는 무림리가 그리웠다.
나는 자전거로 꽤 많은 곳을 여행하였다.
두 달간에 걸쳐 자전거로 호주대륙을 여행한 것을 포함하여, 백두산을 올랐고, 압록강을 끼고 달린 적도 있다. 샤모니몽블랑에거도 자전거를 탔었고, 뉴질랜드의 남알프스에서도 자전거를 탔었다. 네팔의 안나프루나 지역에서도 자전거를 탔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자전거를 탔었다. 나라 안에서도 여러 곳을 자전거로 여행 하였다. 작년 여름에 아내와 한 달 간 해안선을 따라 전국을 한 바퀴 돌았다. 고비사막을 떠날 준비로 훈련의 일부였었다. 지난 겨울에는 내내 자전거를 탔다. 추위를 견디는 훈련이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떠난 것이다.
아쉽다면 ET를 따라 우주로 날아가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꿈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토성의 띠 위성을 따라 돈 적도 있었다.
|
나도 바다가 되어야 했다. |
초원과 도시가 다르듯이 도시와 마을도 각기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다른 것은 서로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기심이 그리움으로 충동되어 나를 떠나게 하는지 모르겠다. 같은 전라도라도 목포와 여수의 말씨가 다르다. 경상도에서도 남해와 부산의 음식이 달랐다. 정이 다르고 의기와 정의가 서로 다른 게 도시와 마을이다. 여행은 그런 서로 다름을 매일 새로 겪어야하는 설렘과 고통이 있다.
여행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2009년 8월 19일, 우리의 최종 목적지 부산에 닿은 날이다.
느리고 지루한 여행이었지만 시간은 우리를 부산에 데려다주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깊은 잠을 잤다. 잠은 명상의 최고 수준이다. 그 잠으로 나는 어제의 그 고통을 반으로 줄였다. 고통의 반을 안고 찜질방에서 나와 부산을 가는 길을 찾았다. 장유중학교를 지나 어느 한적한 곳에서 미싯가루를 물에 타 마시며 아침을 해결하고 응달리-수가리로 이어지는 시골길을 달렸다. 날은 점점 더워졌다.
낮에 태종대에 도착하면 거기서 산 후배 박영동이 기다리기로 하였다.
12시 쯤에 닿을 것 같았다. 59번도로 남쪽을 탄 것이 9시가 조금 넘어서였으니 시간은 충분하였다. 10만분의 1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 가는 데는 도가 통할 정도인 나도 오늘은 실수를 했다. 반이나 남은 어제의 고통 때문일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진해가 나타났다. 길 옆에 있는 주유소로 들어 가 물어 보니 약 20km를 다른 길로 더 왔단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그 화가 어제의 고통을 부풀리며 이성을 잃게 하고도 남았다.
되돌아서 신호대교를 건넜다. 비로소 바다가 보였다.
바다가 나를 진정시켰다. 사고를 내고 미안해 하는 아내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있는 윤구를 위해서도 나는 바다가 되어야 했다.
낙동강하구둑을 건너 하단으로 들어서니 밀집한 자동차가 더위를 더 가증시킨다. 아스팔트는 뜨겁게 열기를 쏟아내고 차량의 매연이 합쳐져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부산을 얼마나 갈망했던가!
태종대 도착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산친구 박영동에게 전화를 했다.
"형님! 거기 어딥니까? 꼼짝도 말고 거기 계시이소. 내가 그리로 갈께예. 오늘 난리도 아닙니더. 덥고 차는 밀리고예."
|
산친구 박영동을 만나다. |
사하에서 박영동을 만났다.
작은 사업체를 경영하는 그는 신형 스타렉스를 몰고와서 자전거와 짐을 짐칸에 실으란다. 부산은 서울하고는 영판 틀리다며 여기서 자전거타기는 장난이 아니란다. 차 안은 에어컨으로 매우 시원하였다. 그 안락함이 새삼스러웠다.
박영동! 그와 함께 등산로프를 묶고 인수봉을 오르던 청년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는가 싶게 우리는 늙어 있었다. 아직도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있는 그는 어디론가 우리를 데려가 점심을 샀다. 가재미회를 먹었다.
좋은 친구는 이런 것이다. 그를 만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어제의 고통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나를 산처럼 대해 주었던 것이다. 그도 나에게는 맑은 산 하나인 것을!
윤구를 부산 버스터미널에 데려다 주었다.
목포에서 부산까지 해안을 함께 달린 나의 또다른 아들 윤구가 인천행 버스를 타고 가기로 한 것이다. 정이 많이 들었다. 무엇이 우리를 서로 이끌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만난 것은 행운이다.
윤구야! 고마워!
|
태종대 |
아내와 나는 다시 태종대로 왔다.
나는 이번 여행의 종착지를 태종대로 삼았었다. 저녁무렵이다. 자전거를 주차장 입구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묶어두고 마지막 유람선을 타고 태종대 해안을 돌았다.
아내와 둘만 남은 것이다. 막걸리 기운이 아니더라도 아내는 아름다웠다. 환갑기념이라고 하여 아내가 자전거여행에 따라 나서준 것도 고마웠고, 무더위와 배탈에도 끄덕없이 완주해 준 것도 아름다웠다.
만약에,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내 아들 창민이가 봉고 밴 차량을 갖고 태종대로 오기로 하였다.
오는 길에 진영 자전거점포에 맡겨두었던 부서진 트레일러를 찾았다.
다음날 아침에 무림리에 닿았다.
우리의 여행을 응원하기 위해 중간, 중간 라이딩을 함께 하였던 나그네님, 너구리님, 오이쨈님, 산장지기님, 마찌님 그리고 트리스탄 윤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우리의 여정은 약 1000km였다.
아름다운 우리의 남해를 사랑하게 되었다.
|
아내는 여전히 아름답다. |